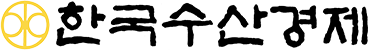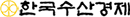나이 많은 한 스님이 있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몸이 마르고 볼품이 없었지만 행동은 수양이 되어서 매우 정결했다. 뿐만 아니라 불교 경전에 대해서도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하루는 스님이 길을 가다가 시장에 가는 한 노인을 만났는데, 이 노인이 암소 등에 닭을 넣은 둥우리를 싣고, 그 고삐를 잡은 채 소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이에 스님도 노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나란히 걸어갔다.
그렇게 한동안 가다 보니, 소가 오줌을 누느라 길가에 멈춰 서는 것이었다.
이에 노인과 스님도 함께 소 뒤에 서 있자니, 마침 한 선비가 다가와서 스님을 희롱하듯 말을 걸었다.
"옛말에 이르기를,
寧爲鷄口 毋爲牛後(영위계구 무위우후)
'차라리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는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후(牛後:소의 뒤)'랍니까?
그러니 내 이제부터 스님을 “우후선사(牛後禪師)'라 부르겠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응대했다.
"이 늙은 중도 선비를 위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중국 당대(唐代)의 시인인 조하(趙河)가
長笛一聲人依樓(장적일성인의루)
'긴 피리 소리 한 가닥 울리니, 길손이 누각에 의지하네.'라는 시를 지었지요.
그런데 이 시가 워낙 유명하니, 그 시의 한 부분을 따서 그를 '조의루(趙依樓)'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또한 구장로(龜長老)는,
松老巖邊月古今(송로암변월고금)
'소나무는 바위 가에서 늙어가고 있건만, 비치는 달은 고금이 같구나.'
라는 시를 지어서,역시 그 가운데 '월고금(月古今)'을 따와서 '月古今 長老(월고금 장로)'로 불리고 있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시(詩)나 말이 좋을 때 그 한 부분을 따서 부르는 관례가 있으니, 지금 '우후(牛後)'라는 좋은 말을 한 선비에게 '우후조대(牛後措大)라는 호(號)를 붙여 부르겠습니다."
이에 선비는 탄복을 하고, 마침내 스님을 방외(方外) 친구로 삼아 친하게 지냈더라 한다.
주(註)조대(措大) : 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쓰는 일반적인 말로는 '샌님'과 비슷한 것임
-닭 둥지를 바랑으로 알다 (鷄巢鉢囊)
옛날 어느 시골에 한 중이 있었다. 이 중은 비록 머리를 깎고 승복은 입었으나 절에 근거지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을로 다니면서 민가의 사랑방이나 빈방을 빌려 자고 음식도 얻어먹는 떠돌이 중이었다.
한편, 이 시골 마을에는 혼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있었다. 이에 그 중이 과부 집을 드나들면서 방도 빌려 자고 밥도 얻어먹었지만, 서로 예의를 지켜 장난을 한다거나 접촉을 하는 일은 없었다.
이렇게 그 중이 과부 집에서 한동안 거처하다 보니, 자연히 과부를 마음에 두고 연정을 품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마음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 혼자 애만 태우고 있었다.
과부 또한 비록 승복을 입기는 했어도 건장한 남자가 한집에 사니, 저절로 중에 대하여 애틋한 감정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달 밝은 가을밤이나 꽃 피는 봄철 외로움이 엄습할 때면, 중이 자는 방으로 달려가고 싶은 욕정이 솟아오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중의 마음을 모르니, 행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 겉으로 내색을 하지 못했다.
하루는 중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런 결심을 했다.
'내 이렇게 애만 태우고 있을 게 아니다. 어차피 한번 부딪쳐 확인을 해본 후에, 수모를 당한다면 멀리 다른 지역으로 떠나 과부를 보지 않고 사는 편이 낫겠다.'
때는 바야흐로 초가을로 접어드는 계절이었다. 이날따라 보름이 지난 달빛이 유난히도 밝았는데, 중은 밤이 깊기를 기다렸다.
첫닭이 울고 나자 중은 옷을 모두 벗어 바랑 속에 넣고, 자신의 보따리 또한 챙겨 바랑 속에 넣은 뒤, 여차하면 이것만 들고 달아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
이에 바랑을 과부가 자는 방문 앞쪽 서까래 못에 걸어 놓고, 과부 방에서 급히 나왔을 경우 그것을 낚아채 달아나는 연습도 여러 차례 마쳤다.
그러고 나자 중은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과부가 자는 방문을 조금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날씨가 춥지 않아 과부는 옷을 모두 벗은 채 이불도 덮지 않고 누워 있는데, 달빛에 비친 그 풍만하고 하얀 살결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워 중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지경이었다.
'내 바로 들어가 저 여자의 몸을 덮쳐야겠다. 그래서 소리를 치고 저항을 한다면, 바로 뛰쳐나와 바랑을 잡아채 가지고 이곳을 떠나 버리면 되는 것이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단단히 결심한 중이 방안으로 들어가 누워 있는 과부의 몸으로 접근하니, 이 때 과부는 두 팔을 벌리며 자신의 몸 위로 덮쳐오는 중을 껴안으려는 자세를 취했다.
곧 이날 밤은 달빛이 너무 밝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루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기에 가만히 살피니, 중이 마루에서 바랑을 낚아채는 연습을 하느라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과부 또한 중이 들어오니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두 팔을 벌리고 안으려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중은 과부가 깊이 잠든 줄 알고 살금살금 접근하다가 갑자기 과부가 두 팔을 높이 뻗으니, 잠에서 깨어 저항하는 것으로 오해하고는 크게 놀랐다. 그리하여 겁을 먹고 부리나케 뛰쳐나가면서 서까래에 걸어 놓은 바랑을 낚아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 달아났다.
그런데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다. 중이 자신의 바랑으로 알고 낚아채 온 것은 바로 그 곁에 있던 짚을 엮어 만든 닭 둥지였던 것이다.
이에 한참 동안 달려서 들판 길로 나온 중이 옷을 입으려고 가지고 온 바랑을 내려다보고서야, 그것이 닭 둥지란 사실을 알았다.
중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닭 둥지를 옆에 두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옷은 모두 과부 집 서까래에 걸어 둔 바랑 속에 들어있으니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다른 동네로 가서 옷을 빌려 입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닭 둥지를 어깨에 걸친 채 부지런히 걸었다.
이 때 마침 새벽 일찍 들로 일하러 나온 농부를 만났다.
"아니, 스님, 새벽에 맨몸으로 어딜 가시는 길인지요?"
이에 중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 이렇게 대답했다.
"예, 천기를 보니 이렇게 해야 내년에 풍년이 들겠기에, 이 모습으로 들판을 걷는 중이랍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저작권자 © 한국수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