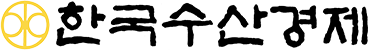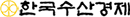K
국내 양식 산업규모는 연간 1조3천억 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질병에 따른 피해액 역시 3천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 1998년 5월 강원도 소양호에서 헤르페스바이러스가 번져 전체 양식잉어의 70%이상이 떼죽음했다. 어류이동만 제한했더라도 피해액을 훨씬 많이 줄일 수 있었다. 또 2004년 7월 제주도에서 바이러스 질병에 걸려 죽은 넙치를 무상으로 거둬 이를 가공하거나 깨끗이 씻어 서울시내 호텔과 일식집 등에 불법 유통함으로써 식품안전에 구멍이 뚫려 한때나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그러나 현행 가축전염병에는 소 돼지 닭 등 가축이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같은 전염성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사체를 소각 또는 땅에 파묻도록 명시돼 있지만 아직도 양식어패류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생산자들이 해마다 골치를 싸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2년 1월 기르는 어업육성법을 제정한 데 이어 올해 들어 1월 수산동물 질병관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변이 생겼다. 이인기(李仁基) 한나라당 의원이 수의사들의 뜻을 모아 의원입법으로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개정법안을 지난 3월 국회에 내놓은 것이다.
수산동물 질병관리법안은 방역협의회 설치와 검역관 제도도입 및 수산동물의 살(殺)처분 등이 주요골자다. 반면 가출전염병예방개정법안은 가축이나 물고기를 구분하지 않고 종전대로 같은 법으로 다스리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충되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도덕성 문제다. 양식어업인들이 그토록 갈구하던 관련 법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사실을 번연히 알면서도 이를 음해하기 위해 물 타기작전을 펼친다는 것은 부처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의아스럽까지 하다. 그동안 수의사들은 어류전문 질병관리사가 없는 틈을 타 어패류 질병을 치료해 왔다.
하나 산업규모가 커지면서 어패류 질병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어의사 제도도입이 필요불가결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수의사들이 의원을 동원해 상반된 법안을 제출한 것은 관련법안의 통과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또 소 양 등 가축을 방사해도 인위적으로 감시 관리가 가능하지만 어류 등 수산동물을 자연수계로 내보낼 경우 사람의 힘으로는 관리 할 수 없다. 그 뿐인가. 가축은 공기를 매개로 하거나 접촉 등으로 질병이 확산되지만 어류는 물을 매개로 질병이 급속히 번질 뿐 아니라 질병종류도 가축의 그것과 확연히 다르다.
이렇듯 검역대상동물이 다르면 검역항목에도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가축은 동물과 그 사체 뼈 살 가죽과 함께 이에 사용되는 용기와 사료 기구 등을 대상으로 검역하지만 어패류는 이식용과 식용 관상용 특히 운반용 물을 검역해 질병원인을 캐기 때문에 영역이 다르다. 말하자면 이런 상황에서 수의사가 어류질병을 다룰 수 있겠는가. 사회의 기능이 다양화되고 날이 갈수록 전문화를 필요로 하는 이때 유독 가축과 어패류를 동일선상에 놓고 질병을 치료하자는 게 말이 되겠는가. 선진 수산국을 보라. 영국은 1937년, 노르웨이는 1997년에 어류 질병 법을 제정했다.
또 캐나다는 1996년 어류건강보호법, 일본은 1999년 지속적 양식생산 확보법, 호주는 1998~2003년 어류질병 및 위생에 관한 관리전략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 이를 놓고 볼 때 세계 제5위의 양식산업국으로 자처하는 우리나라의 몰골이 처량하지 않은가. 마침 지난 달 하순 국회에서 열린 관련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도 많은 생산자들이 이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할지 자명하다고 본다.
그러나 난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농림해양수산위는 생산자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법안을 통과시키겠지만 그 다음 법사위 소위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견된다. 5인으로 구성된 법사위 소위는 주로 법률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율사(律師)들로 채워져 있다. 이들이 학연(學緣)에 기운다면 어떤 낭패를 당할지 모를 일이다.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
저작권자 © 한국수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