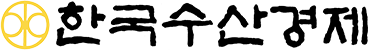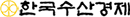K
강무현(姜武賢) 제15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회 인사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고 지난주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그는 해운항만청 출신 공직자로 두 번째 장관이 됐다는 점에서, 또 해운항만과 수산을 두루 거쳤다는 점에서 부내에선 대체로 환영하고 있지만 수산 계에선 그리 달갑지 않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해운항만청 출신으로 드물게 수산정책국장과 수산과학원장까지 지내고 차관까지 오른 그가 수산발전에는 기여하지 않고 외려 수산을 왜소하게 만드는데 앞장섰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10월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 뒤처리를 하면서 보여준 그의 처신은 수산인들에게 한(恨)을 안겨주고도 남았다. 물론 “장관이 있는데 차관의 힘으론 한계가 있지 않느냐”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그 때 정황으로 미뤄 의당 본부 고위직이 책임져야 할 일을 수산과학원장과 수산정책국장의 사직을 강요한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 이 사태로 민물고기에 이어 넙치등 해산어 가격이 연일 떨어져 어업인들이 해양수산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나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쓸쓸히 되돌려 보낸 사실을 우린 기억하고 있다.
그 뿐인가. 동해안어업인 생존권 확보 비상대책위원회가 중국어선들의 동해조업 중단 등 6개항을 해결해 줄 것을 제시했으나 ‘계속 검토 하겠다“고 해놓고 작년 8월 퇴임할 때까지 이렇다 할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떠났다가 이번에 장관으로 취임한 것이다. 이렇듯 해양수산부가 1996년 8월 23번 째 정부조직으로 태어난 이후 역대 장관이 부임할 때마다 수산분야에 애정을 표시하는 등 이런 저런 정책추진을 약속했지만 대부분 허언(虛言) 아니면 실언(失言)으로 끝내고 말았다. 상황이 이럴진대 어업인들이 어찌 이들 공직자들을 믿겠는가.
우리는 이런 장관의 헛소리를 바라지 않는다. 자신의 안일과 출세욕에 눈이 멀어 아무렇게나 지껄이는 그런 장관은 결코 민초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없다.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신뢰가 없다면 그것은 있으나마나다. 그렇다면 소신은 초지(初志)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역대장관은 그러하지 못했다. 하기야 장관이라고 해서 만능해결사는 아니다. 어떤 정책이든 종횡으로 다른 부처와 연관성을 갖기에 장관 혼자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부임할 때와 떠날 때의 생각이 다르다면 그는 실패한 장관이랄 수밖에 없다.
아울러 균형정책을 펴야한다. 해양수산부는 종전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이 주축으로 된 부처다. 그럼에도 불구, 지금의 해양수산부는 조직과 예산면에서 한 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다. 부(部) 신설이전 수산청은 3실3국22과에 인원만도 1천8백93명이었고 해운항만청은 2실4국27과에 직원은 2천1백74명으로 수산청과 엇비슷했다. 예산도 수산청은 6천6백10억 원, 해운항만청은 6천9백11억 원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 수산분야 예산은 해운항만분야의 그것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양수산부 폐지가 거론되는 이유를 가슴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
강장관은 취임사에서 밝혔듯 수산에 애정을 갖고 자생력 확보 등 개방경제 체제에서 우리 수산업의 밑그림을 그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이 얼마나 실현될지 지켜볼 것이다. 지금 수산업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세계 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WTO-DDA)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추진에 따라 각 국간의 무역경쟁이 치열하다. 그렇지만 조금만 부축하면 회생할 수 있는 수산업을 내팽개치고 지원을 배제한다면 우리산업 가운데 과연 몇 개가 살아남겠는가.
해운업도 1980년대 중반 불황에 몰려 업계가 깡그리 붕괴직전에 몰려있었을 때 해운산업 합리화자금이란 명목으로 3천억 원이란 어마어마한 혈세를 지원, 오늘의 해운업으로 발전한 사실을 강장관은 기억해야 한다. 곁들여 지난 10년 동안 해양수산부 족적을 되돌아보고 구조적 병폐가 무엇인지를 찾아내 과감하게 도려낼 것을 당부한다.
저작권자 © 한국수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