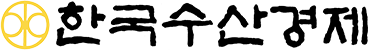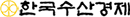2. 역사
소금은 어전과 함께 국가의 주요 재정 수입원이었다. 국가 운영을 위한 주요 품목이자 백성들의 생활필수품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소금의 생산과 유통을 국가가 모두 통제했다. 조선시대에는 소금을 생산하는 염민에게 자유로운 유통과 처분권을 부여했지만 일정한 세금을 징수했으며, 소금이 국가 재원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누락된 공염과 권세가들이 소유한 사염을 찾아내 염세를 부과하는 일이 중요했다.
고려는 전매정책을 추진했지만 조선은 소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가 재정수입을 확대할 목적으로 관염제와 사염제를 병행했다. 조선의 관염은 전체 소금 생산의 7할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 소유의 염분(鹽盆·소금을 만들 때 쓰는 큰 가마)에서 매년 일정액의 공염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가 염분을 설치해 노동력을 동원하고 염창을 두어 관리했다. 당시의 염업 실태를 보면 소금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염분이 가장 많은 곳은 전라도이며 평안도, 황해도 등에도 다수 분포돼 있었다. 염정은 충청도와 전라도 부근에, 염소는 황해·경기· 충청·전라·경상도 등에서 확인됐다.
염소는 공염을 생산하는 시설이나 체제가 마련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염창이 있었다는 것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관염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염정이 없는 함경도와 강원도 지역은 주로 자급자족적 염 생산체제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염정과 염소가 분포한 서남해안은 상품성을 갖춘 염이 생산됐다.
천일염전이 만들어지기 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소금은 바닷물을 끓여서 만든 자염이었다. 지역에 따라 화염, 육염, 활염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방법은 갯벌에 바닷물을 반복해 적시고 갈아서 염도가 높은 함수를 걸러내, 커다란 가마에 넣고 소나무 등을 이용해 증발시켜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자염을 굽던 한 주민은 “사흘 소금 구워 논 세 마지기를 샀다”고 했다. 그만큼 당시 소금은 값이 좋았고 귀했다.
햇볕과 바람에 증발시키는 천일염이 등장한 것은 일제강점기였다. 전쟁 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대륙 진출을 꾀하던 일제는 공업화에 박차를 가했다. 소금이 대량으로 필요했던 이유다. 흔히 “소금을 굽는다”고 할 때의 바로 그 소금이었다. 조선시대부터 사용해온 그 재래적인 방법에 의해 생산된 소금의 국내 소비량은 3분의 2에 불과했다. 나머지 3분의 1은 주로 중국, 일본 등지에서 수입된 소금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입 소금 중에 천일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사실이었다. 국내 소금 값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밀수 소금도 급증했다. 전매청에서 발간한 <한국 전매사>에 의하면 당시 소금 한 가마 값은 쌀 두 가마 값과 맞먹었다. 정부가 소금을 전매하기로 한 것은 이때였다. 우선 입지조건이 좋은 주안에 시험적으로 천일염전을 만든 것이다. 1907년 주안염전에서 최초로 만든 천일염전에서 연간 27통의 소금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대부분의 수입 소금은 ‘청염’이라고 부르는 중국 소금이었는데, 주안에서 생산된 천일염은 질에 있어서도 수입염에 비해 손색이 없었다.
소금 자급자족이 이뤄진 것은 1955년 무렵이며, 그 후 1962년 전매제도가 폐지돼 소비자들이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1963년 제정된 염관리법에 의해 소금은 광물로 분류됐다. 그 후 1977년 소금 수입이 자유화되자 가격 하락을 우려한 대책으로 폐전정책이 추진돼 염전은 크게 감소했다. 염전이 감소하자 염전의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본격적으로 논의됐고 마침내 2008년 신안의 대동염전과 태평염전 두 곳이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이뿐만 아니라 2008년 3월에는 천일염도 다시 식품으로 인정받게 됐다.
저작권자 © 한국수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