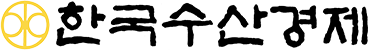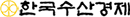해파리
성윤석
해월(海月)이라고도 불렀답니다. 바다의 달, 정약전은 유배지에서 얼굴과 눈도 없이 치마를 드리워 헤엄을 친다고 기록하고 있습죠. 달이 치마를 드리워 세상의 사람을 어디론가 어디론가 알 수 없는 이끌림과 당김을 향해 가게 하듯 오롯이 바다가 뒤집어져야 해파리 떼들이 다시 사라지겠지만 오늘은 시월의 달이 너무 부풀어 저 빛의 치마를 견딜 수 없군요. 그래요. 떠나온 곳의 미련처럼 오늘은 해파리 떼도 몰려왔군요. 그래요. 가고 있는 길의 두려움처럼 바다에 수만의 달빛 치맛자락들이 꽃잎처럼 멀어져 있군요. 저 꽃잎들의 간 곳을 내가 새롭게 기록한다면 달빛 하나 바람에 훅, 날려 당신 자는 곳 창가에서 휘날릴까요.
※ 성윤석 작가는…
경남 창녕 출생. 1990년 <한국문학> 등단. 시집 <밤의 화학식>, <극장이 너무 많은 우리 동네>, <멍게> 등.
저작권자 © 한국수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