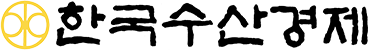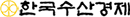고명석 서해해경안전본부장
지난 10월 9일 불법 중국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사건이 있었다. 그 이후 해경은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불법어선에 대해서는 공용화기 사격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어쩌다가 민간어선에 소총도 아닌 공용화기까지 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 서해바다가 좁다보니 양국에 있어 앞마당 역할을 해왔다. 중국은 15세기 명나라 정화의 원정을 제외하고 주로 대륙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구해 왔다. 불법 중국어선이 우리바다에 들어온 지는 오래됐다. 그럼에도 서해를 사이에 두고 오랫동안 중국과 별 다툼이 없이 지내왔다.
그러나 최근 산업화·근대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중국 연안이 황폐해진 반면 생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우리나라 바다가 중국어선의 무대로 변했다. 또한 1994년 ‘UN해양법 협약’이 발효되면서 이전까지 무주물처럼 자유롭게 이용하던 바다가 주요한 소유권의 대상으로 변했다. 바야흐로 경쟁의 바다가 된 것이다.
필자도 해경함정을 타고 가거도 인근에서 불법 중국어선 단속을 지휘해 본 적이 있다. 낮에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에서 눈치를 보던 중국어선들이 밤이 되면 수 백 척 씩 무리지어 경계선 안쪽으로 밀고 들어왔다. 칠흑 같은 밤바다를 어지럽게 수놓은 중국어선 불빛 속으로 경비함정 한 척이 이리저리 오가며 뒤쫓는 모습은 차라리 애처롭기 까지 했다. ‘중과부적(衆寡不敵)’이라는 말이 걸맞은 상황이었다. 어디 그 뿐인가? 삼지창을 빼닮은 쇠창살을 설치해 등선을 방해하거나 도끼, 낫,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는 모습은 해적(海賊)을 연상케 한다.
많은 중국어선이 처음부터 폭력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이 검문에 협조적이었고 단속대원이 중국선원에게 라면이나 담배를 건네주는 풍경은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중국에서 수산물 가격 급등, 불법조업 담보금 상향 등과 함께 일부 폭력 저항이 성공하면서 타 어선에 학습효과까지 생겼다.
불법조업 형태는 변화했지만 이를 단속하는 우리의 방식은 제자리걸음이다. 불법이 확인되면 정선을 명령하고 도주하는 중국어선에 고속단정을 강제로 접안시켜 단속대원이 뛰어올라 제압하는 방식이다. 몸과 몸이 부딪쳐야 문제가 해결되는 육탄전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부상을 당한다.
기원전 481년 벌어졌던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 살라미스 해전 방식이 그랬다. 당시 그리스 연합 해군은 뱃머리 부분에 충각이 부착돼 있는 삼단 노선을 이용해 페르시아 배를 옆에서 들이받고 병사들이 뛰어올라 육탄전을 벌였다. 우리 중국어선 단속과 비슷한 전술인 것이다.
그렇다면 바다의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기원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중국어선 단속방식을 지속해야 하는 걸까? 그리고 우리 해경의 무사 안녕만을 기도해야 하는 걸까? 무엇보다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우리 바다를 지키겠다는 정부차원의 의지와 행동이 선행돼야 한다. 더불어 의지와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예산지원을 통해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단속방식을 연구해야 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전자기 펄스(EMP : electromagnetic pulse)라는 것이 있다. 이는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고, 중국어선의 전자기기만을 무력화시켜 정선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극렬한 폭력 저항에 맞서면서 등선해서 제압하는 현행 단속방식을 벗어나 신체적이 접촉 없이 단속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중국어선 단속임무만 수행하는 단속전용함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있다. 중국어선에 직접 계류가 용이하고 튼튼한 재질의 중형 함정을 건조해 취약 해역에 집중배치 하는 것이다.
이제 불법 중국어선의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됐다. 그렇지만 관심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국민의 성원에 더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