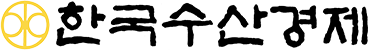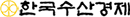L
역사는 인간의 집단적 경험에 대한 기억이다. 그것이 잊혀지거나 무산될때 우리는 인간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경험을 기록한 것을 역사라고 일컫는다. 현재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스쳐가는 순간일뿐이다.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이미 과거에 존재한 것이어서 역사의 일부가 돼 버린 것이다. 지혜있는 행동이란 것도 과거 경험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공적 또는 사적 인간사에 속한 행동에 대해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어떤 대답이든 어떤 류의 역사에서 찾지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역사란 정확하게 반복하는 법이 없다. 어떠한 역사적 상황도 어떤 다른 역사적 상황과 동일한 법이 없다. 유사한 두개의 사건도 최소한 첫 번째의 사건은 선례가 없는데 반해 두 번째 사건은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역사는 하나의 교훈을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리테스는 “당신은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다 항시 새로운 물이 당신곁을 흐르고 있기때문이다”라고 설파했다. 무한한 탐구의 주제가 되는 역사는 진리에 대한 호기심과 갈증을 이끌어내는 자극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역사적 탐구의 정신은 개인의 의견과 가치관, 상상력이 작용하는 주관적 측면이 정당성을 지님으로써 생기를 얻는다.
그럼에도 불구, 한국해양연구원은 왜 이같은 역사적 현실을 외면하는가. 지난 1일 부설 극지연구소 개소식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큰 잔치를 벌였다. 장승우(張丞玗)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 국회의원과 관련단체장 등 3백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또 모든 언론매체에 이러한 행사를 홍보해 달라며 보도자료까지 돌렸다. 전문지의 경우 해양수산부 직원이 기자실까지 자료를 갖다 놓았다. 보도자료는 사실에 충실하고 대외적 신빙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모두 7쪽으로 된 그 속에는 중대한 역사적 사실을 고의로 누락시켰거나 왜곡한 부문이 없지않았다.
첨부자료로 내놓은 극지연구소 주요연혁 가운데 우리나라가 남극해 크릴새우조업을 역사적 사실을 빠뜨린 것이다. 1978년 12월7일 부산항을 떠난 남북수산 소속 남북호(5549t)가 세계 8번째로 남극해에 진출, 91일동안 황파(荒波)와 싸우면서 크릴새우 5백11t을 잡아 FAO(유엔식량농업기구)에 보고함으로써 그 공을 인정받아 1985년 4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원으로 가입된 것이다. 24개국이 회원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남극해양생물의 어획 및 조사를 실시, 인류평화에 공헌할 것을 목적으로 삼고있다. 또 1986년 11월에는 세계 33번째로 남극조약 가입이라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그 뒤를 이어 1988년 2월 남극세종기지를 준공했고 1990년 7월에는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정회원으로 됐다. 그후 2002년 4월에는 북극 다산기지를 개설한데 이어 이번에 해양연구원 내 극지연구센터를 분리, 극지연구소로 개편한 것이다. 익히 아는바와 같이 지구표면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남극은 지구상에 남아있는 원시대륙이다. 그 대부분은 얼음과 눈으로 덮여있는 황량한 땅이다. 그러나 이곳 연안에는 크릴새우만도 학자의 견해에 따라 다르나 대략 5억~7억5천만t이 분포, 서식하고 있다. 세계 수산물 생산량이 연간 1억3천만t을 맴돌고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만한 미래의 식량단백질자원을 지구 어느 곳에서 구할 수 있을것인가.
이뿐만 아니다. 웨델해와 동남극 아메리빙붕연안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부존자원량만도 4백50억이상 매장된 것으로 과학자들은 추산하고 있다. 또 프린스찰스산맥의 철광석과 남극반도의 구리와 몰리브덴, 듀펙단층지괴의 백금과 니켈, 납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지하에 파묻혀있다. 특히 남극빙산은 수자원이다. 이는 세계 총담수량의 70%나 된다. 사정이 이럴진대 한국해양연구원은 극지연구소 발전에 초석이 된 남극해 크릴새우잡이에 나선 개척단 1백5인의 숭고한 정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시 남북호에 승선, 취재에 나섰던 기자는 1979년 1월30일 오전 9시경 파고 16~17m, 순간초속 43m의 강풍앞에서 두손을 모아 ‘하느님’을 외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선수를 가로 막은 시계(視界)는 불과 5백m 안팎이었다. 선체주위엔 무수한 빙붕(氷棚)과 거대한 빙산이 빽빽이 둘려싸여 사면초가(四面楚歌)였다. 이렇듯 생명을 담보하고 유사이래 처음으로 남위 50도 선상의 남극수렴선을 통과한 남북호는 황천(荒天)항해를 거듭하면서 크릴새우잡이에 열중한 것이다. 옛 탐험대원들은 이들 해역을 가리켜 ‘표효하는 40도’ ‘미친 50도’ ‘외마디치는 60도’라고 불렀다. 이처럼 뱃사나이들은 바다를 개척하면서 소리없이 수중고혼이 되기도 했다. 1963년 12월30일 오후 5시반 미국령 사모아 동북쪽 남태평양에서 참치를 잡던 원양어선 제2 지남호(110t)는 느닷없이 불어닥친 강한 돌풍에 휘말려 타고있던 선원 23명이 수장됐다.
또 있다. 1967년 9월15일 오후 7시 북태평양의 넓은 바다에서 연어조업에 나섰던 제302 삼수호(100t) 등 자선 2척이 높은 파고에 견디지 못해 침몰하면서 29명이 불귀의 객이 됐다. 이처럼 바다를 갈고닦다가 숨진 개척자들은 헤아릴 수 없다. 한국해양연구원이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1985년 11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을 부각하는 이유는 뭔가. 그들을 과소평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윤석순(尹碩淳․당시 국회의원)씨를 단장으로 한 한국 해양소년단연맹 관계자 17명으로 구성된 탐험대가 불과 20여일간의 남극관측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왜 남극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한 남북호 크릴조업에 대한 업적을 기록조차 하지않는가. 지난해 12월6일 남극 세종기지 주변에서 갑자기 휘몰아친 돌풍 때문에 목숨을 잃은 전재규(全在奎)대원의 죽음에 대해 국민 모두가 애도했다. 그는 값진 학문의 탐구를 위해 남극 월동대에 참여했다가 목숨을 잃은 것이다. 실로 소중한 희생이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우린 가슴속에 고이 간직해야한다. 역사의 발전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다. 이를 교훈삼아 우리세대가 후대에세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참된 역사든 그릇된 역사든 후대들을 위해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
저작권자 © 한국수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